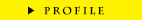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이상재 교수의 한국의 건강문화
나의 전공은 한의학 중에서도 예방 한의학이다.옛날 사람들의 건강법.
의료 이전에 불로장생,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건강문화-양생.
최첨단 의료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현대인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몸 관찰을 통해 알아낸 ‘몸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몸을 위로하는 방법’이 더더욱 절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건강문화연구센터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건강지향적 요소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보급하는 일을 한다. 사실 티테라피도 우리의 전통 다도(茶道), 다례(茶禮) 문화와 몸에 좋은 것을 끓여 마시는 우리의 주전자 문화를 현대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한국식 약선을 재정리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풍류 사상과 조선의 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몰두한 수양법 등을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을 위한 스트레스 케어법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학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학위 취득 (한의학)
[경력]
- 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건강문화연구소 소장
- 전 티테라피(카페+한의원+건강문화교실) 대표이사
[저서]
- 2011 『한의사의 다방』
뻥튀기 아저씨 차를 만들다

뻥이요~~ 뻥!
어릴 때 시골 장에서 뻥이요~ 하는 소리가 나면 재빨리 귀를 막고 숨었던 기억이 있다. 뻥이요~ 하는 뻥튀기 아저씨의 외침 뒤에 따라오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뻥 소리. 쌀이며 옥수수도 튀겨먹고, 떡국 뻥튀기도 별미였다.
지금 사는 우리 동네에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뻥튀기 아저씨가 있다. 20년도 넘게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이 모퉁이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아저씨의 넉넉한 인심 덕에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비가 오는 토요일이면 아저씨를 볼 수 없어서 서운할 정도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이 앞을 지날 때면 아저씨와 한참을 놀다 오곤 한다. 나는 이 동네가 참 좋다. 뻥튀기 아저씨가 우리 동네를 정감이 넘치는 동네로 만들어 준듯하다.

뻥튀기의 화려한 변신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아저씨가 튀겨 놓은 옥수수 뻥튀기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집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튀겨 간다고 했다.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오는 재료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단다. 예전에는 떡국, 쌀, 찰옥수수 등이 주였는데 지금은 검정콩, 둥굴레, 돼지감자, 우엉, 무, 비트와 같은 것들이 많단다. 집에서 주전자에 끓여 먹을 것들을 튀겨가는 사람들 덕에 요즘 재미가 쏠쏠하다신다. 그야말로 뻥튀기의 화려한 변신이었다. 어쩌면 추억 속으로 사라질 뻔한 뻥튀기가 새로운 수요창출에 성공한 것이다. 정말 그랬다. 지난번 갔던 구례 오일장에서도 뻥튀기 기계 옆에 사람이 가장 붐비는 듯했고, 뻥튀기 기계도 여러 대 놓여 있었다. 그날의 핫 아이템은 돼지감자와 무였다.

뻥튀기 기계주위에서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정보 교류도 활발했다.
못 보던 재료가 튀겨져 나오면
“이게 뭐냐?”
“어디에 좋으냐?”
“어떻게 먹느냐?”
“텔레비전에서 보니 이게 어디에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볶으면 맛도 좋아서 주전자에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마신다.”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네”
우리나라 독특한 건강문화의 한 모습이다.
차를 만드는 것
뻥튀기 기계의 힘을 빌지 않고 가정에서도 차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차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약간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일일 뿐이다. 내가 마실 차를 만드는 일은 내 몸을 위한 조그만 정성이며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내 몸을 위로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마시는 차는 내가 만들어 마시라고 말하곤 한다.
차를 만드는 일은 다르게 말하면 ‘잘 우러나게’하기 위한 일이고 동시에 ‘맛있게 하기’ 위한 일이다. 로스팅과 추출을 통해서 커피가 만들어진다면, 녹차는 덖고 비비거나 증숙을 통해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커피나 차에 이런 특별한 수고를 더하는 것은 추출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숨겨진 맛과 향을 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나는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차가 된다. 주로 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하는 정성이 더해지는 셈이다. 제각각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그 향과 맛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볶아서 차를 만드는 방법
모든 것은 불기운을 받으면 노릇노릇해지고(과하게 받으면 검게 되지만) 구수해진다. 이 구수한 맛은 소화가 잘되게 한다. 누룽지가 그렇고, 보리차가 그렇고, 옥수수차가 그러하다. 달궈진 열판(프라이팬) 위에서 볶아 만들어진 것들이다. 대개의 곡물과 우엉, 무, 연근, 돼지감자와 같은 전분이 많은 뿌리들은 볶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볶는 방법은 본래 가지고 있는 맛과 향에 구수한 맛이 더해지게 되어 순수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수한 맛에 관대하여 비교적 쉽게 수용을 하는 편이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시중의 음료들(옥수수 수염차, 17차, 류 등)도 베이스는 다 구수한 맛이다. 맛에 대한 기호 역시 문화적 경향성을 바탕에 둔다. 일본사람들도 구수한 맛에 관대하나, 서양 사람들은 구수한 맛에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반응을 보인다. 구수하거나 약간 진하게 우러난 차를 보고 수프 같다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을 몇 만났다. 강한 향으로 서양에서 사랑받는 페퍼민트(박하)나 시나몬(계피)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사람을 드물지 않게 만난다. 서양사람들은 향에 민감한 듯하고 동양사람들은 맛에 민감한 듯하다.

© 이상재 교수의 한국의 건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