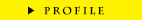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12. 홍합, 해녀와 홍합따기

혹시 섬에 가게 되면 요즘 홍합을 따는지 물어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녀 집을 찾아간다. 가격 물어보고 주문을 한다. 해녀가 말할 것이다. 오늘 5시쯤 가지러 와라, 또는 내일 3시쯤 와라. 그날 간조 시간에 맞춰 물질을 하기 때문이다.
민박집이면 주인에게 주문을 부탁해도 된다. 해녀들에게 사면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 보통 1킬로에 몇천 원이다. 보통 크기로 열몇 개 된다. 물론 껍데기째 무게를 단다. 우리가 돼지갈비 살 때 갈비뼈 빼고 무게 달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개수 작으면 그만큼 살이 꽉 찼다는 소리이니 적다고 속상해할 일은 아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 삶는 것이다. 해녀는 팔기만 한다. 손질은 산 사람의 몫이다. 껍데기에는 이런저런 잡물이 많이 달라붙어 있다. 식칼 뒷등으로 탁탁 쳐서 긁어내듯이 떼어낸다. 칼이 없으면 날카로운 부분으로 다른 홍합을 손질한다. 그다음 씻는다. 바닷물에 씻어도 된다.
냄비(코펠 큰 것이 되겠지만)에 넣는다. 물은 맥주잔 반 정도만 붓는다. 국물을 먹겠다면 칼로 뿌리 부분을 매끈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다. 더 깨끗하게 손질하고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된다.
도대체 얼마를 더 부으라는 말이냐, 이런 소리는 계모임 계주한테나 하면 되겠다. 짠맛이 나오므로 간을 보면서 물을 타면 된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을 본 다음 소금 치는 것은 기본이다.
이 국물에 수제비나 칼국수를 해먹기도 한다. 시장에서 산 양식 홍합은 세척한 것이니까 한 번 정도만 씻고 끓인다. 거품 넘치는 것 조심할 것.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다. 입이 벌어지고 알이 동그랗게 보이면 먹는다. 특히 칼이나 껍데기로 관자(껍데기와 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꼭지)까지 도려내어 먹는다. 씹는 맛이 좋다. 운좋으면 진주도 나온다.
대서양 바닷가 도시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레스토랑 메뉴에 피시 fish가 있었다. 대서양 생선 맛은 어떤가 싶어 80프랑이나 주고 시켰다. 나온 것은 홍합탕이었다. 거기 친구들, 이거 겁나게 좋아한다. 내가 홍합 일 할 때 태반이 수출품이었고 전량 유럽행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치즈나 버터를 넣어서 끓여먹는다. 그렇게 해먹고 싶다면 양파나 파를 가늘고 길게 채 썰어 고명처럼 얹는다. 맛보다는 시각 효과.
숯불에 구워먹는 이들도 있다. 불이 괄해도 속에 있는 물기 때문에 곧잘 꺼져버리고 만다. 칼끝을 사이로 집어넣어 물을 좀 빼고 굽는 게 좋다. 안 해본 사람은 손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홍합전 또한 별미이다. 시장에 가면 까놓은 홍합살이 있다. 씻고 물을 빼놓는다. 밀가루 입힌 다음 계란 옷 입힌다. 그 위에 튀김가루나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다. 튀긴다기보다는 지져낸다. 굴전 하는 것과 같다.
단, 굴전은 조금 덜 익혀도 되지만 홍합전은 다 익혀야 한다. 홍합은 날로 먹으면 입이 아리다. 어차피 요리는 배합과 타이밍. 몇 번 하다보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뜨거울 때 먹는 게 좋다. 잘되었다면, 어느 전보다도 맛이 뛰어나다. 말린 홍합으로는 맛이 떨어진다.
자연산은 잘라서 된장국을 끓이거나 죽을 쑤어먹기도 한다. 불 끄기 일 분 전에 양파를 조각내어 넣으면 씹는 맛이 좋다. 식성에 따라 방아 잎을 넣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붉은 게 암컷이고 흰 것이 수컷이다. 암컷이 더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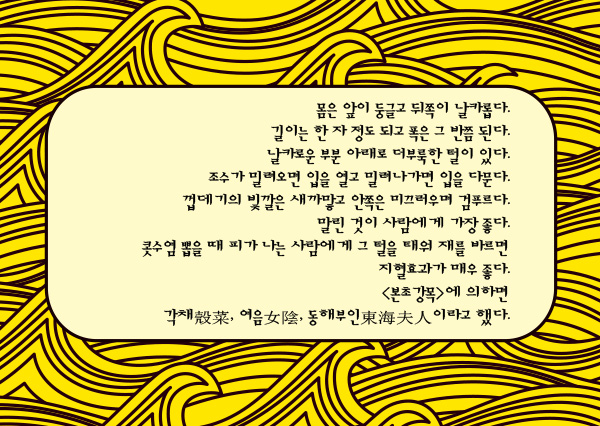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