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의료인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세계 속의 의료인
- [워킹맘 한의사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침구과 전문의로서 활동하면서 침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2019년 미국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의사로서, 강사 및 연구자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해외에서 살아가는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Stuff white people (don’t) like 백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2021년 6월 19일에 진행되었던 대한여한의사회 진로 멘토링 자리에서 미국 진출의 현실에 대해 여한의사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내용으로 준비했지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과 온라인 강의라는 한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 풀어내고 오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끝나고 나니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도 따로 많이 해주시고, 저도 아는 만큼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버는지, 미국 진출의 장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히려 미국 진출 시 명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기에 여기 지면을 빌려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인 상대 한의원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입니다. 뉴욕만 하더라도 맨해튼 코리아타운 200m 거리 안에 한의원이 20개나 될 정도로 많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인은 물론 타인종, 타문화의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한의원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종과 타문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겁니다.
이쯤에서 부끄럽지만 제 개인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도 막상 한의원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동안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현지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서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아시스처럼 제 눈에 들어온 것이 ‘Stuff white people like (백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제 백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바로 진료실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Stuff brown people like (갈색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Stuff black people like (흑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시리즈로 있었다면 전집을 다 샀을 겁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던 시대라 직접 장바구니에 담고, 부끄럽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열었습니다.
충동적인 쇼핑은 항상 후회를 불러오듯이, 첫 장을 넘긴 순간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이 책은 백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좌측 성향이 강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소 젊은 연령층의 백인 친구들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책 속의 소개 글을 직접 인용해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인들은 자유무역 고급 원두로 만든 커피를 홀짝이며 뉴욕타임즈를 펼쳐놓고 동시에 David Sedaris (냉소적인 위트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폰과 같은 애플 제품을 좋아하고, 인디 음악, 빈티지 티셔츠를 좋아하고 (…) 스스로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특이하게도 다 똑같다. (…) 모든 문화와 인종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친구 중 유색 인종 친구가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틀린 내용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한의사인 제가 써먹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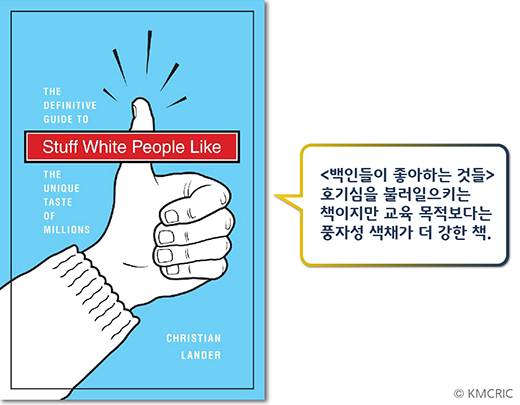
결국 책을 통해 배운 것보다는 직접 다양한 환자들을 겪어보며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기보다 싫어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편이 더 빨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미국 가기 전에 두 번째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괜찮았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매우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문화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정보 노출입니다. 한국에서도 환자분들의 개인 정보 노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환자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라고 해서 미국 의료 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규칙들을 준수한 상태에서만 환자의 정보를 수집, 저장, 그리고 타 의료기관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방금 진료했던 환자 차트를 데스크에 그대로 펼쳐두고 다음 환자가 들어와서 봤다거나, 접수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방금 치료한 환자의 진단명, 받은 치료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분과 이야기를 할 때도 문화적인 차이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까지 미국에서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라서 확실히 미용에 관심이 많군요.”와 같은 발언도 남녀차별에 속할 수 있고, 초진 차트 성별 칸에 Male/Female (남/여)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당연히 안 되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내원한 분들에게도 ‘obesity (비만)’라든가 ‘fat (뚱뚱하다)’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계신 교수님 중 한 분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한 외국인에게 “Eat less. (네가 적게 먹어야 한다)”라고 영어로 답변하셨다가 관중석이 크게 웅성웅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섭식장애를 매우 큰 문제로 보는 서양 문화에서 단순히 환자의 식습관 문제로 비만을 정의해 버리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저도 처음에는 여러 번 실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 환자분에게 남편도 침 치료를 받아 본 적 있는지 알아보려고 ‘husband’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바로 “My wife likes acupuncture too. (내 아내도 침 치료 좋아해요)”라고 답변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배우자에 대해 물어볼 때는 성별이 구분되는 ‘wife/husband’라고 지칭하지 않고 무조건 ‘partner’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가면 한두 번의 실수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가는 것과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공부하고 가는 것은 다르기에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명심하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의사 이승민의 워킹맘 한의사 앤 더 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