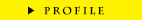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01. 감성돔, 보약 한 재로 치는 맛

아, 손암 선생님.
솔직히 너무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성돔인데, 처오촌 부탁에 마지못해 붓을 든 것처럼 ‘색흑이초소 色黑而稍小’ 다섯 자만 달랑 적어놓으셨다니요. (안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이 기록해놓으신 155종 해산물 중에 얘들보다 이력서 짧은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녀석에게만 야박한 점수를 주셨나요. 하다못해 정체 불분명한 인어人魚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해놓으셨으면서요.
감성돔에 목숨 거는 꾼들이 보면 땅을 칠 노릇입니다. 흑산도에서 16년이나 계셨는데 잘 못 보셨나요? 그때는 감성돔이 없었나요? 설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해놓으신 것의 후손들이 지금도 남쪽 바다를 활개치고 다니는데 감성돔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있었겠지요.
제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열 살도 되기 전에 어른 손바닥보다 큰 것을 여러 마리 낚았습니다. 종이 뭉치에 둘둘 말아놓은 그런 채비로 말이죠. 흔했죠. 요즘 되레 보기 힘듭니다.
지금이 감성돔 철이기는 한데 이놈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낚싯배 타고 섬 뒤편 벼랑 포인트까지 가야 합니다. 종일 낑낑거려봐야 얼굴이나 한번 볼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낚시꾼마다 뭐에 홀린 듯 감성돔, 감성돔, 중얼거리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인기 짱이죠.
예전 완도 바다에서 일할 때 고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왈짜로 큰 탓에, 사람이고 법이고 도무지 무서워할 줄을 몰랐답니다. 당연히 사건사고 많았죠. 감옥도 몇 번 들랑거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향에서 늙고 병든 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억지로 일은 나오는데 쉬 지치곤 했지요. 심지어 그의 왼쪽 팔뚝에 있는 거미줄 문신까지도 퇴색해 날파리 하나 잡아내지 못할 정도였죠.
“아, 감생이 한 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뻘건 피째 씹어 조지면 살겠는데.”
그는 왕왕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입맛을 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감생이 한 마리만 좀 낚아줘, 응?”
저를 조르곤 했습니다. 전 끝내 낚아주지 못했습니다. 낚시라고 해봤자 점심때 잠깐 짬내서 일이십 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향 바닷가 내려와 살고 있는데도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감성돔이었습니다. 맛을 탐하는 입과 낚시에는 젬병인 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들의 팔자지요 뭐.
이처럼 사람들은 감성돔을 일반 생선과는 급이 다른 존재로 여깁니다. 생김새부터가 그렇습니다. 금속 광택의 검푸른 피부에 표창을 잔뜩 꽂아놓은 것 같은 등지느러미는 근사한 전사戰士 같습니다. 살아 있는 왕관 같기도 하죠. 힘도 대단합니다. 선생님께서 낚아보셨다면 이렇게 홀대 안 하실 겁니다.
작은 게 잡혀도 잘 놔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빛감생이, 살감생이 이렇게 그럴싸한 이름을 따로 붙여놓았죠. 참돔 어린 것을 상사리라고 부르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물론 간단하게 써놓으신 이유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우선 그 시절에는 잘 안 잡혔을 겁니다. 이 녀석은 예민함에 있어서 독보적입니다. 목줄이 눈에 보이면 바로 되돌아선다는 게 꾼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설이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서도 물 밖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르셨죠? 아, 그리고 이 녀석들은 성전환을 합니다. 성어가 되면 대부분 암컷으로 변합니다.) 요즘 어선들이 하는 자망그물에도 잘 안 걸리는데 그 당시 낚시나 그물에 얼마나 잡혔겠나 싶습니다.
또하나 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이 별로 안 쳐주었을 겁니다.
생것으로 먹는 것을 보통 회膾라고 부릅니다. 강회 초회 육회 숙회라는 말이 있듯이 생선 외에도 육고기와 버섯, 채소류, 두루 쓰였죠. 당시 흑산도에서 회를 한다면 얇게 포를 떠서 채소와 양념에 버무렸을 겁니다. 그게 대대로 내려온 우리나라 생선회이니까요.
이 조리법은 양념 맛이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강한 생선살을 선호하는 게 보통이죠. 요즘도 전어나 서대, 가오리 따위를 그렇게 해서 즐겨 먹거든요.
감성돔은 체구에 비해 살이 없는 편입니다. 잘 잡히지 않고 살도 적은데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니 흑산도 주민들이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고추냉이 간장에 살짝 찍어먹어야 느낄 수 있는 감성돔의 진미는 그러니까 요즘이나 가능한 것이죠.
아무튼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던들, 저는 겨울바다로 감성돔 낚으러 갈 겁니다. 요즘처럼 추위에 몸이 오그라들 때는 이것 가지고 죽을 쑤어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맛도 죽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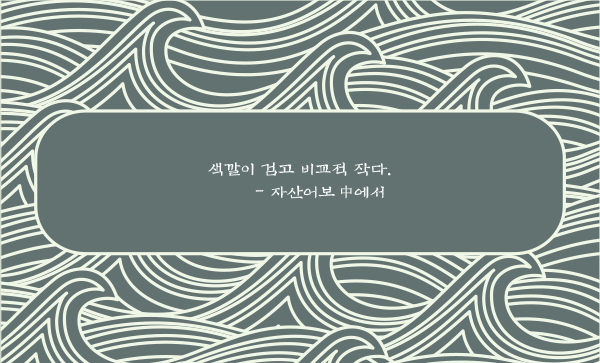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