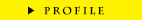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16. 병어,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맛

여수시 연등천에는 지금도 포장마차 골목이 있다. 낮에는 시장이, 밤에는 포장마차가 선다. 시끌벅적 시장이 마무리되면 천변에 붉은 불빛 하나둘 생겨난다. 회사나 도서관, 배에서 하루를 마친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곳엔 즐거움과 고독과 울분이 늘 뒤섞여 있다.
오래전. 나는 영업부 단합대회하고 있는 5번 집, 대학생들이 담당교수를 씹고 있는 19번 집, 해광호 선원들이 네 말이 맞다, 틀리다, 떠들고 있는 33번 집, 남편은 오늘도 어느 술집에 앉아 있을까, 주인아주머니 고민하고 있는 37번 집, 중늙은이들 화투 치러 가기 전 한잔하고 있는 46번 집을 지나 우산을 접으며 51번 집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나를 불러낸 친구와 그의 연인이 앉아 있었다.
둘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연애를 막 시작한 둘은 행복해 보였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였다. 내가 바라보자 아가씨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배시시 웃었다.
“한잔하지.”
“아, 해야지. 안주는 뭐로 할까.”
“아가씨가 먹고 싶은 것으로 골라봐요.”
“우리 병어회 먹어요.”
“거 좋죠.”
항구 포장마차의 매력은 선어회가 있다는 것이다. 선어회는 신선한 생선을 가지고 만드는 회이다. 대신 활어회는 없다. 활어회는 의심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주인을 믿을 수가 없어, 살아 있는 놈을 눈앞에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회는 여덟 시간 정도 지난 것이 가장 맛좋다. 죽음의 시간이 주는 맛이다.
병어는 신선도가 눈에 잘 보인다. 푸른색 도는 은빛이 풍부하고 맑을수록 싱싱하다. 내장도 아주 작아 손질하기가 쉽다. 조림을 많이 해먹는데 으뜸은 회이다. 병어회는 뼈째, 세로로 어슷하게 썬다. 뼈가 연하고 고소해 함께 먹는다. 흰살생선에서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고추장이나 고추냉이보다는 양념된장이 더 어울린다. 여수에선 된장빵이라 한다. 전어나 병어처럼 단맛이 나는 살은 된장이 더 어울린다. 묵은 김치에 싸먹기도 한다.
비 내리는 포장마차. 사랑에 빠진 남녀. 병어회.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다. 친구는 세상을 통째로 얻은 듯했고 아가씨는 흐뭇한 얼굴이었다. 둘은 수시로 어깨를 치고 그것보다 더 자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 흔들며 빗속으로 걸어갔다. 너무 딱 붙어 마치 한 사람이 가는 것 같았다. 보기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멀어지는 둘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제 미래만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다. 양가 인사와 신혼여행과 출산과 아이 백일사진 같은 것.
그러다 나는 다시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경상도 쪽 건설 현장에 있다가 반년 만에 돌아온 나는 다방에서 친구와 만났다. 아가씨와는 잘되어가느냐고 묻자 그는 머뭇거렸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담배도 두 대나 피우고 난 다음에야, 이별을 통고하고 가버렸다고 대답했다.
헤어진 이유는 딱히 기억에 없다. 아마 주변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이유를 여자 쪽에서 댔을 것이다. 성격이나 문화 차이 같은 거. 그리고 부모의 반대나 근사한 남자의 돌발적인 출현, 뭐 그런 것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친구는 최소한, 가난했다.
그의 허탈은 무겁고 깊었다. 그날처럼 비가 왔다. 우리는 걷다가 빗줄기가 거세어지자 51번 포장마차로 들어섰다.
“뭐에다가 한잔할까?”
내가 고개 들어 장어나 낙지 따위를 고르고 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말했다.
“삼춘, 병어 잡서. 오늘 들어와 물이 좋아.”
아주머니 말대로 병어 몇 마리가 반짝거리며 누워 있었다. 나와 친구는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다시 병어회. 비 내리는 포장마차. 실연당한 친구. 완벽한 조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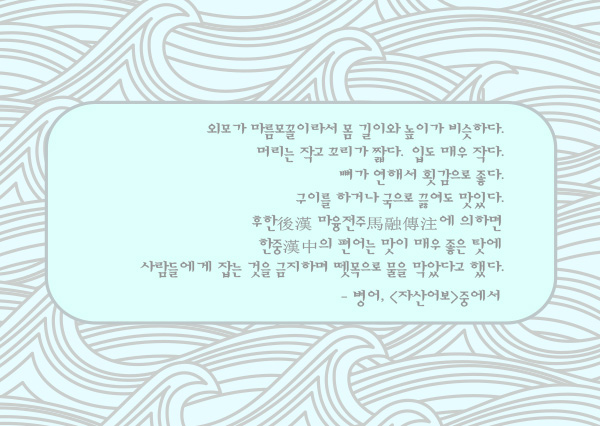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