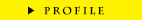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18. 고등어, 가장 놀라는 맛

예전에는 “고등어를 어떻게 회로 먹어요?”라고 주로 반응했다. 살아서도 썩는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요즘은 제주도 직송 고등어회가 왕왕 텔레비전에 나온다. 그래서‘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들어보니, 역시나 비싸다. 하긴 비행기 타고 간 게 값쌀 리가 있겠는가.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말은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말보다 더 불쌍하다. 못 사먹는다면 방법은 하나. 낚아 먹으면 된다.
의외로 고등어회는 갈치회나 도미회보다 먹기 쉽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잡아봤을 것이다. 사실, 낚시꾼에게는 고등어가 귀찮은 존재이다. 번개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물 틈이 없다. 그만큼 낚기 쉽다는 뜻이다. 초보자라도 쉽게 낚을 수 있다. 고등어는 전갱이와 함께 방파제나 갯바위에 일 년 내내 수시로 드나든다.
인터넷이나 낚시 채널 같은 데서 고등어가 문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동네 낚시점으로 간다. 초보라 말하면 채비에 대하여 설명해주거나 아예 만들어주기도 할 것이다. 낚싯대도 흔한 민장대면 충분하다. 민장대는 릴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밋밋한 낚싯대이다. 물고기는 낚싯대 보고 물지 않으니 비싼 것 살 필요 없다. 낚싯대와 줄, 자그마한 찌와 봉돌, 바늘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면, 낚고 있는 사람 근처에 서서 따라 하면 된다. 몇 번 하면 익숙해진다.
고등어는 금방 죽는다. 그러니 얼음에 보관해야 한다. 살이 부드러워 회 뜨기가 쉬우면서도 어렵다. 비늘을 긁어내고(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긁어내는 게 좋다) 내장을 따고 등뼈의 피를 긁어내고는 깨끗하게 씻는다.
간단하게 회 뜨는 방법은 이렇다.
물기를 닦아내고 척추를 따라 한쪽 면씩 떼어낸다. 그것을 반대로 놓고 갈비뼈 쪽을 얇게 발라내고는 한 점씩 잘라낸다. 껍질이 남도록. 보통의 회처럼 껍질을 떼어내다보면 살점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면 한정 없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따라 해보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것 잘하는 친구와 같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혹시 싸웠다 하더라도 낚고 썰고 한잔하다보면 화해는 금방 된다. 또 싸울지 모르니 빨리 배워둔다.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기 좋은 것은 가족이 와서 아빠가 회 떠먹이는 모습이다. 모름지기 애비란 먹을 것을 물어오는 존재이니까.
고등어회는 당연히, 아주 싱싱해야 한다. 살을 눌러보아 조금이라도 물렁거린다 싶으면 횟감이 아니다. 초고추장이나 겨자냉이에 식초를 조금 쳐먹으면 좋다. 그런데 이 짓, 할 줄 알게 되면 두고두고 도맡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은 고려하시길.
큰 놈을 제대로 해먹겠다면 등 쪽으로 칼을 넣어 등지느러미를 잘라낸다. 다음 한쪽 면씩 떠낸다. 그리고 반투명한, 껍질 바깥의 막을 벗겨낸다. 그래야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얼음물에 잠시 담갔다가 씻어 물기를 닦아내면 맛이 더 좋다. 기름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연습 좀 해야 된다. 연습 없이 잘되는 게 어디 있던가. 하다못해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구이나 찜으로도 좋다. 방파제에서 낚은 고등어는 작은 것이 보통이다. 작은 것은 맛이 떨어진다. 그래도 내 손으로 잡은 게 어디인가. 손질하여 소금 간을 해두면(냉동해놓으면 된다)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다. 찜은 묵은지와 함께 지지면 좋다. 찜 요리법은 인터넷에 잔뜩 나와 있다.
그나저나 원봉이는 이원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장찬리 이장이라도 되었으려나. 씩씩하기는 하지만 워낙 소박한 성품이니 경쟁 우선의 요즘 세태와는 어울리지 못했을 것 같다. 이장이 되었다면, 그리고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다면, 버섯찌개나 오소리탕은 뒷날로 미루고 고등어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엄마와 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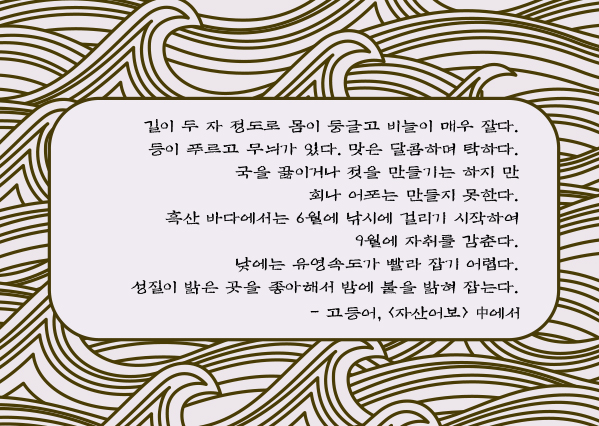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