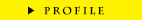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19. 농어, 나 먹었다. 자랑하는 맛

나는 섬으로 다시 돌아왔다. 산 중턱 빈집을 얻어 들었다. 이삿짐을 부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거였다. 바람 맞으며 걷다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맑아진다. 좁은 곳은 더 자주 걷게 된다. 어린 왕자처럼.
섬은 산책과 낚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첫날 새벽, 산책을 나서면서 나는 루어대를 집어들었다. 산책 장소는 해수욕장. 농어는 봄철부터 물기 시작해서 한여름이 절정이다. 새벽이나 저물녘에 잘 문다. 해안에 바짝 붙는 습성도 있다.
슬슬 해수욕장 걸어다니며 나는 캐스팅을 했다. 이 여유로운 시간이 스스로 좋아 웃기도 했다. 깔다구(어린 농어)라도 한두 마리 낚으면 아침 밥상부터 화려해질 판이었다. 일은 그때 일어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어가 문 것이다. 십 분 정도 지났을 때 확 잡아당기는 놈이 있었다. 드래그를 풀며 치고 나가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순간 녀석은 물 위로 몸을 솟구쳤다. 이른바 바늘털이를 하는 것이다. 언뜻 봐도 7~80센티미터급(이 정도 크기는 따오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럴 때 사실 아무 생각 안 난다. 낚시는 물었을 때와 물지 않았을 때, 두 가지의 인간이 만들어진다. 낚아내던 순간을 떠올려보면 백지장처럼 하얗게 기억이 없다. 생각은 사라지고 몸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도망치려는 물고기와 잡아올리려는 사람 사이 힘의 기우뚱한 균형, 줄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허용하며 녀석을 지치게 하는 긴장의 순간들만 이어진다.
그리고, 툭.
채비가 터졌다. 세상에 줄 끊어진 낚싯대처럼 허무한 게 또 있을까. 낚시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몸에서 피가 쭈욱 빠져나가고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을.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절망을. 그래도 일단은 농어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 나는 바닥까지 꺼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세워 새 루어를 달았다. 하지만 귀향 기념 선물로 바다는 한번 더 나를 약올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다. 비슷한 크기가 다시 물었고 녀석을 제압하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또 줄이 터지고 말았다.
가벼운 채비가 화근이었다. 울 것 같은 기분으로 달려가 튼튼한 채비를 가지고 왔으나 그뒤로는 입질이 없었다. 물이 빠지면서 녀석들도 물러난 것이다. 산책이고 나발이고 나는 탈진한 몸으로 돌아왔고 땅바닥을 치고 또 쳤다. 천 길 나락으로 꺼진 기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아-, 하-. 비탄의 감탄사만 한 200번쯤 뱉어냈을 것이다. 탄식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다.
"야속한 고기야. 야속하기도 야속하다. 그치만 어쩌겄냐, 물에서 놔주지를 않으니."
그때부터 찢어진 보물지도 주운 아이처럼 공연히 바빠지기 시작했다. 눈만 감으면 농어가 나타나서 혀를 쑥 내밀고는 휙 돌아 사라졌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낚싯대를 쥐고 길을 나섰다. 농어가 나올 만한 곳은 아침저녁 문안 가듯 착실히 찾아가 낚시를 던졌다.
5일간 그랬다. 나중에는 어깨가 빠져나갈 것 같았다. 그동안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했다. 이 녀석들 아니었으면 잘 알고 있는 포인트 찾아다니며 우럭이나 벵에돔 따위를 착실히 낚았을 것이다. 참돔도 물 때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서운함 가라앉고 다른 것에도 손을 뻗을 수 있었으니 세상사 무엇 하나 쉽게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물론, 농어가 물면 피곤한 줄도 모른다. 낚시의 두 가지 인간은 이 경우에도 통한다. 안 물면 지루하고 심심하고 맥이 풀린다. 하루종일 낚시터에 빈손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누가 싸움을 걸어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고기가 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소생을 한다. 눈빛이 서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이빨도 번뜩인다. 거의 변신이다. 300년 묵은 동자삼童子蔘도 이 정도 순간 재생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체념의 공간이 활기 충전의 그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신기하기까지 하다.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간다면 야광찌를 준비해본다. 밤이 되고 밀물이라면 노려볼 만하다. 지렁이를 끼우고 수면 아래 1.5미터 정도 바늘이 내려오게 하여 던진다. 그게 어려우면 원투 하면 된다. 무거운 봉돌 달아 멀리 던지는 채비를 원투라고 한다. 한동안 입질이 없으면 확인 필요. 복어가 잘 따먹기 때문. 물지 않으면 간간이 하늘을 쳐다본다. 문득 별똥별이 쏟아져내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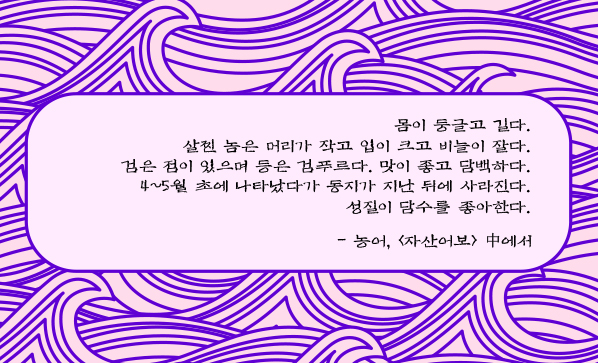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