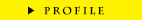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이강재 원장과 떠나는 8체질 여행
‘과연 체질은 몇 가지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상의학과 8체질의학이 임상의 대처에 유용하다면, 다른 숫자를 표방하는 여타의 체질론 또한 나름대로 유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굳이 체질의 가짓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체질론이 일관된 논리와 형식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또 인체에 적용하여 재현성 있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8체질론과 8체질의학은 현재, 사람의 몸을 바라보는 가장 탁월한 체질이론이며 치료체계이다.체질을 알아도 살고 체질을 몰라도 산다. 자기의 체질을 알고 나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체질을 알고서도 여전히 잘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자기의 체질을 몰라서 계속 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체질을 모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체질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면 제대로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칼럼이 그 길을 쉽고 자상하게 안내할 것이다. [학력]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력]
• 8체질 전문 커뮤니티 Onestep8.com 개설
•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 강사
•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 임상8체질연구회 창립
[저서]
『학습 8체질의학 Ⅰ/Ⅱ』, 『임상 8체질의학 Ⅰ/Ⅱ/Ⅲ』, 『개념8체질』, 『체질맥진』, 『시대를 따라 떠나는 체질침 여행』, 『8체질론으로 읽은 동의수세보원』, 『수세보원 들춰보기』
#38. 내일이 없는 날이 온다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Mount Everest)의 이름은 1852년에 영국인들이 붙였는데, 영국의 측지학자인 조지 에베레스트의 측량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그전에 티베트어로 초모랑마 (대지의 여신이란 뜻)라는 이름이 이미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네팔어로는 사가르마타 (네팔어: सगरमाथा अञ्चल)이다. 중국에서는 티베트 발음을 따서 한문으로 珠穆朗瑪라고 쓴다.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다. 주요 등반 루트는 17개가 있고, 그 주변에 부분적으로 개척한 4개의 변형 루트가 있다고 한다.
셰르파
네팔에서 히말라야 고산을 오르는 등반가를 전문적으로 돕는 셰르파 (Sharpa)가 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길 안내와 짐 나르기, 텐트 설치, 로프 설치 등을 맡는다.
셰르파는 원래 티베트어로 동쪽의 사람이라는 뜻인 샤르 빠 (Shar Pa)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네팔의 종족 이름이기도 하다. 셰르파족은 16세기 때 티베트 동부 캄 지방에서 네팔의 산악지대로 이주했다. 티베트 고산족의 일부인 셰르파족은 고지대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인지라 고산병에 걸리기도 하고 베테랑이라고 해도 폐수종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질병
보건과 의학과 의료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관심을 둔다. 임상의학은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료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쳐서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어떠한 의학의 영역이라고 해도 의학은 사람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질병’이라고 하면 다양한 관점과 정의와 약속이 존재할 것이다.
산
질병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사람이 병을 앓는 일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즉 병이 산이다. 오르고 내려오는 길이 어렵지 않은 동네 뒷산은 가벼운 병이다. 깊고 어렵고 위태로운 병은 오르기 힘든 높고 험한 산이다. 질병이 산이라면 의사는 가이드이다. 어려운 산에 가려면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르고 또 내려온다. 산악회에 들어가 리더를 따라 동일한 산에 가서 한 코스로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혼자만의 독창적인 루트를 즐길 수도 있다.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의 여러 조건에 따라 나타내는 증상의 양태나 회복되는 정도는 다양하다.
사람들은 산에 올랐다가 내려왔지만, 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산을 경험한 것뿐이다. 이처럼 질병은 사람의 몸을 지나간다. 사람이 산을 경험하듯이 지나가는 질병을 경험하는 것이다. 등반 중에 다쳐 장애를 얻기도 하듯이 질병은 사람의 몸에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질병에 지면 사람은 죽는다. 질병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질병의 임무이다. 또 사소하든 중대하든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사람의 몸을 급박하게 혹은 완만하게 혹은 지긋하게 혹은 지루하게 지나간다. 질병의 증상이란 사람이 질병을 경험하면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질병에 져서 죽지 않는다면 사람의 몸은 질병을 겪어내는 것이다. 그런 후에 몸에는 질병의 흔적이 오롯이 남는다. 마치 컴퓨터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기록 (log 記錄)이 남듯이 말이다.
유명한 등반가라도 종종 산에서 죽는다. 산악인이 산에서 죽지 않는다면 자신이 선택한 루트와 코스를 통해서 그 산을 경험하고 나오는 것이다. 질병은 몸에 흔적을 남기고 산악인에게는 경력이 쌓이게 된다. 환자가 질병을 겪어내는 동안 가이드인 의사도 옆에서 그 질병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것이다. 알피니스트들이 히말라야의 고봉들을 정복하였노라고 떠들어대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듯이 인간은 질병을 정복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저 산을 경험하고 나온 것일 뿐이고 질병 또한 그렇다.
죽음
동무 공은 “세상에 공평한 이치는 목숨(公道世間有壽命)”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단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 가지는 모든 생명체는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다. 예수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드도,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칭기즈칸도, 소크라테스도, 다빈치도, 스티브 잡스도 모두 죽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암
누구든지 생명의 끝이 있다. 죽음이다.
암(癌)을 기생체로 인체를 숙주로 보는 태도는 잘못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감염시킨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옮겨 간다. 그러나 암은 전염되지 않는다. 암은 인체의 생명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신생물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내 몸의 바탕에서 어떤 기전에 따라 내 몸의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한 것이다.
암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역할이 있다. 바로 몸을 죽음으로 이끌려는 것이다. 즉 암은 생명체의 죽음이라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철저하고 적극적인 ‘죽음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암은 생명의 끝에 있는 죽음이 지금의 나에게 보낸 전령이다. 암은 내게 남은 생명의 힘을 빼앗으러 왔다. 그리고 암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에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조난
암이 험한 산이라면 이때 의사는 히말라야에서 등반가를 돕는 셰르파와 같다. 셰르파는 가이드이면서 짐꾼이다. 환자가 병을 잘 헤쳐 나가도록 돕고 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불안을 대신 져주기도 해야만 한다.
에베레스트 첫 등정 (1953년 5월 29일)이라는 영예를 역사에 남긴 뉴질랜드 힐러리 경 (Sir Edmund Persival Hillary)이 등정 중에 크레바스에 빠진 적이 있는데, 같이 자일로 연결되어 있던 텐징 노르가이 (Tenzing Norgay)가 끌어내어 살려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환자가 질병의 수렁에 깊이 빠졌다. 이건 등반가가 등반 중에 조난을 당한 것과 같다. 산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셰르파는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한다. 직접 도와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가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조언이라도 해야 한다.
내일이 없다면
8년 전에 식도암인 걸 알았고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재발하였는데 또 수술을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만 받았다. 지금은 식도가 거의 막혀서 액상 형태의 음식을 겨우 넘기고 있다. 병원에서는 배에 위루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분은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다. 내 동료의 소개로 왔는데 세 번 치료받은 후에 오지 않는다. 그분께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밤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내일이 우리 중 누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그렇다.
오늘의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이 없는 날은 언제든지 온다. 다만 오는 때를 미리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 이 순간을, 오늘을 슬기롭게 잘 버텨내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버티는 것이다. 지금 내게 남아 있는 생명의 힘을 가능한 한 암에게 적게 빼앗기면서 버티는 것이다.
암이 생명과는 반대쪽에서 왔듯이 암을 알게 된 그 순간 지금까지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과 태도, 행동과 실천으로 나를 변혁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암에게 쉽게 지지 않고 오래오래 암을 경험하며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 암 역시 치료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과 의료 분야에서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가.
© 이강재 원장과 떠나는 8체질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