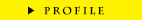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09. 가자미, 계절을 씹는 맛

여자는 겨울 내내 육지로 나가는 여객선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리이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유난히 거칠었다. 남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삼치 낚시를 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빈둥거렸다.
짜증이 나서 밖으로 나오면 차가운 북서계절풍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바람이 파도를 할퀴고 있는 바다는 모가지가 하얗게 꺾인 물보라만 가득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르르 몸서리가 났다.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까지 다 그랬다. 이보다 더 을씨년스럽고 스산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걸어서 오 분이면 마을이 끝나기에 마실 다닐 곳도 마땅찮았다. 쇼핑센터, 문화센터, 극장, 서점, 이런 거 전혀 없다. 목욕탕도 없다. 길에서 스치는 이들도 모두 목을 움츠리고 다녔다.
지루한 낮을 간신히 보내면 길고 긴 밤이 왔다. 저녁마다 남자는 말 들어줄 귀를 동냥하러 나갔다가 취해 돌아왔다. 섬은 몇 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찾아 빙빙 도는 것으로 겨울나는 곳이라는 것을 여자는 알게 되었다. 곯아떨어진 사내를 보며, 저런 것을 따라 이런 곳으로 들어온 내가 미쳤지, 탄식을 되풀이했다.
손톱만큼 남아 있던 참을성이 바닥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봄이 왔다. 여자는 육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화들짝 놀란 남자가 어르고 말리고 빌었으나 그럴수록 결심은 더 굳건해졌다. 그때 친구가 집 밖에서 그를 불렀다.
“어제 도다리 물었단다. 같이 도다리나 낚으러 가자.”
사내는 가방꺼내는 여자를 노려보다가 욱해서 한마디 내뱉고 집을 나섰다.
“그래, 시원하게 가버려라.”
그리고 낚시하다가 육지로 나가는 여객선을 보았다.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주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우울하고 막막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집에 있었다.
“아, 가겠다며? 가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왜 안 갔어?”
“도다리는 먹고 가려고.”
도다리는 가자미, 넙치와 더불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물고기이다. 셋 다 가자미류이다. 이 가자미류는 종류가 워낙 많아 500종이 넘는다. 자, 구분해보자. 넙치는 광어이다. 가자미는 가자미다. 참가자미, 용가자미, 줄가자미, 범가자미, 돌가자미 등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돌가자미를 도다리라 부른다. 생김새 비슷하다보니 다른 가자미도 그냥 도다리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다리는 가자미이다. 진짜 도다리는 먼바다에서 잡힌다.
또하나 헷갈리는 것. 광어와 도다리. 이 둘을 구분할 때 ‘우도좌광’ ‘좌도우광’ 소리들 한다. 눈이 어느 쪽에 있는가, 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고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우도좌광이다.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왼쪽에 있으면 광어이다. 반대로 뒤쪽에서 내려다본다면 좌도우광이다. 언젠가 낚시채널에서 낚시대회를 열었다. 한 사람이 도다리를 낚아왔다. 심판관이 도다리 정면에 서서 “좌도우광이니까 이것은 광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동해안에서 잡히는 강도다리는 광어처럼 눈이 왼쪽에 있다. 노랑 바탕 지느러미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녀석이다. 정작 광어는 어릴 때는 눈이 양쪽에 있다가 크면서 왼쪽으로 몰린다. 참나, 왜들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도다리는 대량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한 놈들이기도 하다.
‘봄도다리 가을전어’라는 말이 있듯이 봄철 도다리는 맛이 일품이다. 회도 좋고 국이나 찌개, 구이 다 맛있다. 그래서 봄이면 가까운 바다로 도다리 낚으러 가는 낚싯배들이 많다. 편대채비(좌우 벌린 채비로 목줄 엉킴이 없다)로 고패질을 하면서 낚는다.
모래밭이나 모래와 펄이 뒤섞여 있는 곳이면 원투로도 낚을 수 있다. 미끼를 워낙 잘 삼키기에 던져놓고 다른 짓 하다가 와보면 물어 있기도 하다. 자리가 괜찮으면 두세 개씩 던져놓기도 한다.
이곳 거문도에서는 ‘딱괴이’라고 부른다. 괴이는 고기의 이쪽 지방 말.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펄이 별로 없어 많이 나지는 않는다.
사내는 오늘도 도다리 낚으러 나갔다. 아내는 아직 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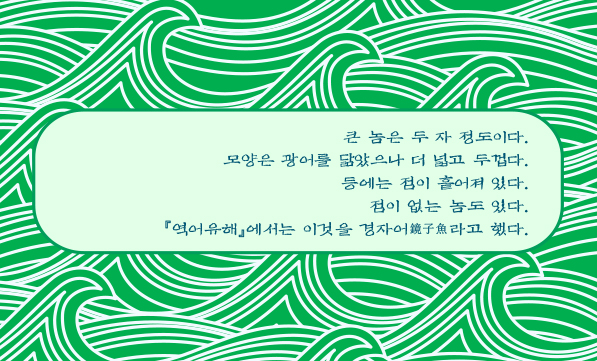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