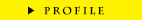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21. 삼치, 아홉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손 가는 맛

삼치는 보통 수심 20~70미터 사이에서 낚아올린다. 배를 몰면서 낚싯바늘을 그 깊이까지 가라앉히려면 무거운 납을 잔뜩 매달아야 한다. 그 무거운 것을 손에 쥐고 종일 바다를 싸돌아다니며 하는 일이라 들고 고생도 심했다. 추석이 다가올 무렵이었는데 우리 둘은 며칠째 똥깡구(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이르는 섬의 말)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오늘도 공칠 것 같으니 차라리 나가지 말까, 우리는 잔뜩 의기소침해 있었다. 풀죽은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갑자기 마당으로 걸어나가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일갈을 내질렀다.
“귀신은 읎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아들하구 손자하구 자기 제사 지낼라고 쎄빠지게 고생을 하는디, 귀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읎다. 귀신이 읎는 것이 분명하니께 올해부터는 제사 안 지낼란다. 인자 제사 지내지 말자.”
할아버지는 태평양전쟁 때 사이판 바다에서 미군 폭격기에 돌아가셨다. 추석 전전날이 제사였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어장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하는 경고요 협박이었던 것이다.
삼촌은 그러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기가 차다는 듯 허허, 웃었다. 아무래도 노망이 제대로 나버리고 만 것 같다고 살짝 귓속말도 했다. 할머니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부엌일을 시작했고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바다로 나갔다.
채비 넣자마자 4킬로그램 넘는 삼치가 연달아 물어댔다. 방어도 쉬지 않고 물었다. 그런데 삼치 어장 나간 열댓 척 배 가운데 우리만 낚았다. 다른 배는 고시 한 마리 구경도 못했다. 고시는 어린 삼치를 이르는 말이다. 낌새를 챈 배들이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나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수협 어판장에 간 배는 우리가 유일했다.
우연일까?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부리나케 삼치떼를 몰아주었을까? 다음날도 마을 배들이 우리만 따라다녀 난감했지만 덕분에 제사는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제사 때만 되면 마누라한테 한소리 들은 할아버지가 바닷속에서 낑낑대며 삼치 몰아주는 장면이 떠올라 나는 죄송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손암 선생께선 맛이 텁텁하고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다. 웬걸. 독보적인 맛을 지닌 게 삼치이다. 예전 어떤 회갑 잔칫상에 좋다는 회가 여러 가지 올라왔다. 도미, 농어, 돌광어…… 무엇부터 먹나보니 모두 삼치회에 먼저 손을 뻗었다.
삼치도 회로 먹는다. 아니, 회부터 먹는다. 기름지고 부드러워 치아 없는 노인들에게도 좋다. 씹을 것도 없이 녹는데 고소하기 그지없다. 비린 것을 싫어하는 이들도 이것만큼은 맛있어한다. ‘쇠고기보다 삼치 맛’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뱃살이 가장 맛있고 그다음이 꼬리 쪽이다.
근데 맛이 없다고? 왜 그러셨을까. 사실 『자산어보』의 설명도 일반 삼치와는 약간 다르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무기 망蟒 자를 쓰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망어 외에는 삼치로 추측될 만한 어류가 없다.
한국해양연구원 명정구 박사께 문의를 하자 ‘동갈삼치’(긴 방추형으로 삼치보다 통통한 편이다. 등은 청흑색, 배는 은백색이다. 옆쪽에 40여 개의 가는 물결무늬가 특징이다. 서, 남, 제주 해역에서 열대 해역까지 넓게 분포한다. 수면 가까이 빠르게 헤엄치면서 작은 생선을 먹고 산다. 대형어이다)일 거라는 답이 왔다.
그러면 그렇지. 손암 선생께서 삼치 맛을 보셨다면 분명히 여러 줄 쓰셨을 텐데. 흑산도 바다 것을 모두 자셨으면서 하필 삼치 맛을 못 보셨구나. 구두 가게 사장님은 슬리퍼 신는다더니.
삼치회는 내륙 횟집에서는 못 먹는다. 선어鮮魚 보관이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막 잡은 삼치를 얼음에 채워놔도 이틀이 한계이다. 회 뜨기도 쉽지 않다. 워낙 부드러워 조금만 거칠게 다루면 살이 뭉그러져버린다. 남해안 항구 식당에서 간혹 사먹을 수 있다. 서해안 태안반도 쪽에서도 제법 난다.
또하나의 방법은 얼리는 것이다. 싱싱한 상태에서 포를 뜬 다음 랩으로 싸 얼려놓으면 나중에도 맛볼 수 있다. 냉동회는 초보자도 썰 수 있다. 단, 녹이면 안 된다. 언 상태의 회를 먹는 것이다. 질감이 셔벗 같다.
가을이면 저 수심 깊은 곳으로 삼치떼가 몰려온다. 겨울에 가장 맛이 좋다. 이 시절이면 바다에 삼치 낚는 배로 가득하다. 택배로 사면 1킬로그램에 평균 7천 원 내외이다.
몸통을 약 2센티미터 두께의 슬라이스로 자른 다음 소금물에 넣고 몇 시간 두면 간이 밴다. 이것을 소포장으로 냉동해놓으면 구이로 아주 좋다. 대가리와 뼈는 매운탕거리가 되고 껍질은 데쳐먹는다. 매운탕은 약간의 고추장 된장 풀고 간 맞춰 끓이면 된다. 묵은지를 넣으면 더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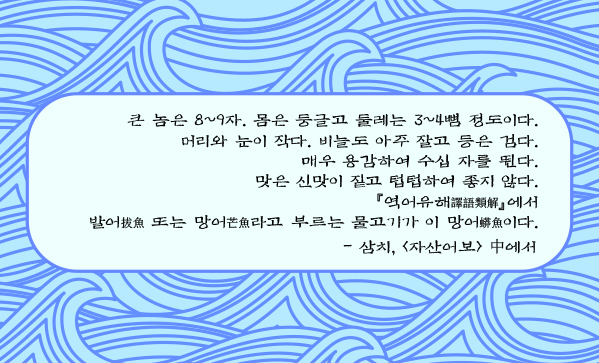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