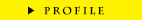생활 속 한의
Home > 지식솔루션센터 > 생활 속 한의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저자 한창훈은 1963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태어나면서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시작되었다.세상은 몇 이랑의 밭과 그것과 비슷한 수의 어선,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일곱 살에 낚시를 시작하고 아홉 살엔 해녀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는 한국작가회의 관련 일을 하고 대학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삶을 주로 써왔다.
먼바다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대양 항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동료 작가들과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을 타고 부산-두바이, 홍콩-로테르담 두 번의 대양 항해를 했고
2013년에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다녀왔다.
8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원고 쓰고, 이웃과 뒤섞이고, 낚시와 채집을 하며 지내고 있다.
대산창작기금, 한겨레문학상, 제비꽃서민소설상, 허균문학작가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청춘가를 불러요> <그 남자의 연애사>,
장편소설 <홍합> <나는 세상 끝을 산다> <꽃의 나라>,
산문집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썼다.
어린이 책으로는 <검은섬의 전설>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가 있다.
KMCRIC은 출판사와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아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생선과 해조류 편 일부를 연재합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의 생명 기운과 맛이 독자 여러분께 듬뿍 전해지길 빕니다.
#13. 고둥, 철수와 영희의 소꿉놀이 같은 맛

종류가 많은데다가 (<자산어보>에 열세 종류가 등장한다) 딱 하나만 찍을 필요가 없어서 원문 인용을 피했다.
고둥은 둥글게 말려 있는 껍데기를 가진 연체동물이다. 라螺는 소라인데 고둥의 종류에 포함된다.
고둥에 관한 나의 첫번째 기억은 어떤 소녀이다.
초등학교 가기 직전이었다. 무슨 일인가로 외가 큰댁에 갔다. 어른들은 모두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내 또래는 없었다. 심심하게 왔다갔다하던 나는 아랫집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소녀를 보았다. 힐끔거리고 있자니 그 아이가 말했다.
“나랑 곡석(소꿉놀이) 할래?”
나는 엉거주춤 다가갔다. 처음으로 소꿉놀이를 해본 게 그때였다. 나는 남편이, 그 아이는 아내가 되었다.
소녀는 여러 가지 고둥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노를 젓고 그물 올리는 흉내를 내고 돌아오자 그 아이는 고둥 껍데기와 동백나무 이파리, 질경이 찧은 것으로 밥상을 차렸다. 전복 껍데기는 접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배고픈 어른들이 그러하듯 과한 소리를 내며 먹는 시늉을 했다.
“뱃일 하고 왔으니 술도 마셔야지.”
소녀는 가장 큰 껍데기를 들어 내 입에 대주었다. 나는 어부처럼 술을 마셨다.
“맛이 어때?”
“좋아. 너무 맛있어.”
소녀는 빙그레 웃었다. 뒤로 묶은 꽁지머리는 반듯했고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그 위에서 반짝거렸다. 나는 소녀가 좋아졌다.
나는 가슴이 떨렸다. 눈감고 있는 시간은 잠깐 동안이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밥을 먹고 뱃일을 하러 나가야 했지만 그 순간이 며칠 전 맞은 주삿바늘처럼 깊게 박혔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지만 우리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아이 엄마가 부르며 무언가를 시켰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알았다고 답을 하며 아쉬운 얼굴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접었다.
어른들은 윷놀이할 때 고둥 껍데기를 말로 썼다. 윷놀이 말은 제 동네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한다. 이를테면 벌교에서는 꼬막 껍데기를 쓴다. 나는 어른들이 걸이야, 모야, 하면서 말을 옮길 때마다 소녀가 생각났다. 고둥 껍데기를 가지고 갔을 텐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누구와 소꿉놀이를 할까, 를 생각했다.
고둥 껍데기는 섬마을 예술활동의 재료로도 쓰였다.
친구 오빠의 방을 방문했을 때 그는 색색의 고둥을 나무판에 본드로 붙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하트, 배 형상,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것은 이미 완성되어 벽에 붙어 있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언제 만들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했다. 사람들 사이의 충만한 사랑이, 병이 나으면 이런 배를 사가지고 어장을 하겠다는 다짐이, 우리나라 통일이 그것들 속에 들어 있었다. 가장 큰 작품은 미완성이었는데 거문도 봉우리들을 형상화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바닷가에 가면 고둥은 지천이다. 잡아먹기 가장 만만하다. 맛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두 먹을 수는 있다. 사리 때 물이 나면 많이들 잡으러 간다. 만약 현지 주민이 갯것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주로 잡는지 물어본다. 아래쪽이 평평하고 삼각형 모양에 몸집이 큰 것을 시리고둥이라 하여 제일로 친다.
잡았으면 해감한다. 바닷물 담은 그릇에 넣어두면 된다. 백사장 주변의 갯바위에서 잡았다면 모래를 머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한 번씩 흔들며 오래 해감한다. 샘플로 몇 개 삶아보아 모래가 씹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삶았으면 까먹을 차례.
고둥을 깔 때는 핀을 찔러넣은 손은 그냥 두고 고둥을 돌려야 쉽게 빠진다. (몇 개 돌려보고 머리 부분이 계속 떨어져나온다면 덜 익었다는 소리이다.) 통째로 빠졌다면 아주 정교한 동그라미를 보게 될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은 최소한 한 가지씩 재주가 있기 마련인데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동그란 무늬는 리본체조 선수들도 따라갈 수가 없다.
꼬리 부분에 노란 살이 있다면 그게 생식소이다. 기름기가 많아 변비중인 사람에게 좋다. 반대로 배탈중인 사람은 피한다.
울퉁불퉁한 것은 다시리고둥으로 매운맛을 낸다. 손암 선생도 다시리고둥 小劍螺에 대하여 “맛이 달면서도 매운 기운이 있다”고 하셨다.
물론 이 맛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머리 아래, 치마처럼 얇은 막이 살을 약간 덮고 있는 게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쓴 맛이 난다. 싫으면 이것을 떼어내고 먹는다. 그냥 먹기도 하고 간장양념을 하여 반찬으로 먹기도 한다. 섬에서는 전분을 풀어 탕을 하기도 한다.
게고둥도 있다. 빈껍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녀석들이다. 키워보겠다고 가져가기도 하는데 금방 죽는다. 이 녀석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다리를 끊는 습성이 있다. 큰 것은 돌돔 미끼로도 쓰인다.
그나저나 짧은 순간 나의 아내였던 소녀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실제 결혼은 어떻게 했으며 지금쯤은 어떤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을까.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